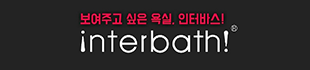가을을 짓는 도시의 향수(鄕愁)
그럴듯한 머리말에 벌써 시 한 편 지어낸 듯하다.
먹은 나이만큼 四季를 돌며 어김없이 가을도 곁에 있었다.
시인은 흥얼흥얼 노래한다. 늘 후렴구만.
높은 하늘과 단풍, 가을비에 망설인 쓸쓸함과 석양의 향수만 그리듯이.
대자연의 완성에 감정의 낙서로만 덕지덕지 그림을 덮은 것 같다.
가을에 입힌 색은 내가 아는 뻔한 색들뿐이다.
촌, 사람이라야 고향의 멋을 그려냈으며 다른 감성 가락에 후렴구 같은
노랫말의 표현 또한 그 향수를 대신할 어떤 색깔도 도시엔 없었다.
내겐 향수가 없다. 그저 달달한 감정의 순간이 도시의 밤에 꿈결로 왔을뿐.
그래도 가을 색을 한껏 마음에 담고 살았다.
화려함으로 채색된 도시의 하늘도 내겐 역시 가을 하늘이다.
세월 지나 없다고 생각했던 도시의 향수를 원 없이 그려 내려가 본다.
고개들어 올려다본 밤하늘 별들과 소원을 빈 보름달, 가을바람에 춤추는 낙엽들….
뭐가 다를까? 다르다는 걸 알아버린 나는 어떤 하루를 향수로 끌어낸다.
가을을 짓는 시인이자 화려한 도시의 고단함을 채색하는 화가이고 싶은 순간이다.
무르익은 가을의 풍요로운 들판과 마주한 퇴근길 포장마차의 진한 여운들!
수없이 많은 날과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모습과 그리움은 다르지만,
누구라도 도시의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건….
꼭 지금이 아니어도 옛것이 아니어도 가을을 짓는 이의 마음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그리움 결이기 때문이다.
그 하늘 아래 향수의 목마름은 어디여도 아무래도 상관없다.
지독한 가을의 향수가 철 지난 나의 도시에도 콕 박혔다.
김선영 작

인사이드피플 논설위원 金 仙 渶